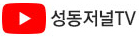[최준영의 즐거운 서평38]김종해·김종철 형제시집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읽고...
내 어머니는 어디서든 음식가지를 챙겨오는 습관이 있다. 젊은 시절 홀몸으로 자식들 건사하느라 본능적으로 몸에 익혔을 그 습관이 칠순을 훌쩍 넘기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어디 노인정의 경로잔치든, 하다 못해 이웃집에 마실을 다녀오실 때에도 어머니의 손에서는 어김없이 무언가가 흘러나온다. 그게 떡 한 쪼가리가 됐든, 사탕 한 개가 됐든 나는 그저 무렴하게 받아먹지만, 아내와 딸아이들의 눈에는 그런 풍경이 낯선가 보다. 아내는 어머니의 보자기를 마지못해 받아두지만 몰래 내다버리기 일쑤고, 딸아이들은 할머니가 건네주는 눅진한 과자부스러기와 사탕을 여지없이 외면해버린다. 하긴 먹을 게 세고 센 시절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닌가.
나는 아내와 아이들의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한편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 눈가로 피가 몰리기도 한다. 어머니의 저 습관이 나를 키운 힘이었거늘. 어머니의 그 정성 덕분에 과분하게도 초등학교 3학년 즈음 비록 짖이겨질대로 짖이겨져 떡이 되다시피 했던 바나나라는 귀한 과일을 맛볼 수 있었고, 어느 부잣집 잔치의 부엌일을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 종이에 둘둘 말아 챙겨오신 살집 좋은 갈치 한 토막으로 밥 한 공기를 해치울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요즘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도무지 두문불출이시니 덩달아 내 입성도 부실해진 느낌이다.
김종해, 김종철 형제시집 <어머니, 우리 어머니>(문학수첩)를 읽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게 어머니의 절뚝이는 걸음새에 대한 생각이었다. 반평생 누이와 나를 챙기시느라 무진 고생을 했던 어머니의 두 다리는 영영 고쳐질 수 없는 걸까. 수술을 하면 나아질까, 물리치료만으로도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두 시인의 작고하신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던 모양이다. 구구한 설명 없이 시속에만 오롯이 담긴 시인들의 어머니 모습은 어찌 그리 나의 어머니와 닮아있는 걸까. 아니 세상의 어머니들이 모두 시인들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와 닮았으리라. 생김생김은 아니어도 그 마음, 자식들 기르시느라 노심초사하셨을 마음씀씀이만은 하나였을 것이다.
이제 나의 별로 돌아가야 할 시각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지상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나의 별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이름/ 어·머·니-- 김종해 사모곡 전문
돌아가시기 전 두 시인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맷돌을 돌린다/ 숟가락으로 흘려넣는 물녹두/ 우리 전가족이 무게를 얹고 힘주어 돌린다/ 어머니의 녹구, 형의 녹두, 누나의 녹두, 동생의 녹두/ 눈물처럼 흘러내리느 녹두물이/ 빈대떡이 되기까지/ 우리는 맷돌을 돌린다/ 충무동 시장에서 밤늦게 돌아온/ 어머니의 남폿불이 졸기 전까지/ 우리는 켜켜이 내리는 흰 녹두물을/ 양푼으로 받아내야 한다/ 우리들의 허기를 채우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맷돌일 뿐/ 어머니는 밤낮으로 울타리로 서서/ 우리들의 슬픔을 막고/ 북풍을 막는다/ 녹두껍징을 보면서 비로소 깨친다/ 어머니의 맷돌에서/ 지금도 켜켜이 흐르고 있는 것/ 물녹두 같은 것/ 아아,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 김종해 어머니의 맷돌 전문
종일 날품으로 보자기를 채워 돌아와 허기 대신 차라리 허기진 생각을 놓자며 잠을 청했던 누이와 나를 깨워 허기를 면케 해주셨던 나의 어머니나 맷돌로 녹두를 갈아 4남매의 생계를 이어주셨던 시인의 어머니. 아아, 그리도 닮으셨구나. 그러나 닮은 게 어디 어머니들뿐인가.
나는 어머니를 엄마라 부른다/ 사십이 넘도록 엄마라고 불러/ 아내에게 핀잔을 들었지만/ 어머니는 싫지 않으신 듯 빙그레 웃으셨다/ 오늘은 어머니 영정을 들여다보며/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하고 불러 보았다/ 그래그래, 엄마 하면 밥 주고/ 엄마 하면 업어 주고 씻겨 주고/ 아아 엄마 하면/ 그 부름이 세상에서 가장 짧고/ 아름다운 기도인 것을!
-- 김종철 엄마 엄마 엄마 전문
시인 김종철은 4남매의 막내다. 공교롭게도 나 역시 4남매 중 막내이며 사십이 넘었어도 막내 티를 벗지 못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딸아이 듣는대서 종종 엄마하고 불러 아내의 핀잔을 듣는 것도 닮았다. 그러나 엄마, 아니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의 영정을 들여다보며 엄마를 그리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나는 헤아릴 길이 없다. 헤아릴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시인들은 새삼 어머니를 외쳐보자고 자신들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리 하지 못했던 게 천추의 한으로 남았다고 나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친다. 이제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만세, 우리 어머니 만세라고 불러보자고.
시인의 모꼬지, 시인의 잔칫날에/ 시인 형제는 고향으로 간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대신동 위생병원 625호실/ 어머니가 날린 철새 두 마리가/ 기우뚱 기우뚱 남쪽으로 가고 있다/ 11월의 첫째 주일/ 우리들 마음에 단풍이 내리고/ 차창에 우수의 빗방울이 맺힌다/ 대신동 위생병원 625호실/ 날개를 접고 우리는/ 어머니의 손등, 마른 칡껍질 위에 가서 앉는다/ 떡장수, 국수장수, 충무동시장 좌판 위에/ 우리 어린 날의 날개를 기워 주던/ 어머니의 외로운 바느질/ 젊은 어머니가 끌고 가는 수제비 리어카를 뒤에서 밀며/ 우리가 나가 보는 황량한 겨울바다/ 우리는 50년대의 카바이트 불빛으로 떨면서/ 어머니 만세, 어머니 만세를 목젖으로 삼킨다/ 시인 만세, 시의 날에/ 날개를 접은 두 마리의 새가/ 자꾸만 헛짚는 어머니의 하늘 위를/ 떠돌고 떠돌다가/ 어머니의 먼 섬 어디에/ 개동백 꽃잎으로 피다가.....
-- 김종해 개동백 꽃잎으로 피다가 전문
새삼 신께서 모든 곳에 임할 수 없어 대신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탈무드 구절이 떠오른다.
원본 기사 보기: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1599(수원시민신문)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저작권자 © 성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